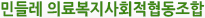[발로뛰는 동네의사 야옹선생의 지역사회 진료일지]
"내 힘으로 의사 됐는데 '공공재'라니"?...억울해하는 후배들에게
박지영 민들레 의료사협의 지역사회의료센터장
안녕하세요. 저는 민들레의료사협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왕진과 방문 진료를 하며 지역사회를 발로 뛰고 있습니다. (발로뛰는 동네의사 야옹선생의 지역사회 진료일지 바로가기 ☞ : 클릭)
최근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이 화제가 되면서 '공공의료'가 화두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네 의사로서 생각하는 '공공의료'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룹니다. 즉 인간의 기본권과 직결된 것이죠. 의료가 인간 기본권으로서 구체화 된 것은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영국은 국영의료제도(NHS)를 만들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이 하는 모든 활동은 '공공의료'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공공의료'를 따로 분리하여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의사의 역할은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역할도 있지만 병원을 유지하는 경영자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공공성'과 '사익성'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과잉진료, 기피과, 지역에 따른 의료의 불균형 문제도 생기는 것이겠죠.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의사의 '사익성'을 줄이고 '공공성'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 정부가 현재의 의료는 그냥 두고 아예 '공공의료'의 영역을 따로 만들려 하니 기존 의사들이 반발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의사들 대부분이 환자를 위해 일하는 '공공성'을 이미 지닌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정당하여 분노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의대 졸업 과정과 인턴, 전공의 과정에서 도움받은 것도 없는데 '공공재'로 제약을 받는다고 억울해하는 후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국가지원금 얘기는 차치하고 우리가 의대에서 가장 먼저 하는 해부학 실습부터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해부학 실습에서는 실제 시신을 가지고 하게 되고, 이 시신은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해 스스로 기증한 분들의 몸입니다.
그리고 인턴과 전공의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와 환자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지만 사실 의사가 성장하는 것은 환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의사의 행위는 환자의 아픔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결국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환자입니다. 그것도 온몸으로 말이죠. 실제로 의학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거치며 발전해왔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도 많습니다. 환자에게서 질병의 정보들을 얻고, 환자에게 약을 쓰거나 여러 가지 치료법을 시행하면서 배워가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사에게 최고의 보람은 아팠던 환자가 건강을 되찾고, 삶을 제대로 영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응급환자를 제때 처치하여 살려내고, 병이 진행되기 전에 찾아내 치료를 하고, 곪아서 썩기 직전의 상처를 매일 치료하여 회복시키는 일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직접 치료한 환자가 나날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이런 기쁨도 환자가 주는 것이죠.
저도 환자들에게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받습니다. 제가 장애인 주치의로 종종 방문하는 독거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어르신의 가장 큰 걱정은 본인이 홀로 죽어 기증 서약한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방문할 때면 제가 의사가 아니라 그냥 할머니 댁에 놀러 가는 손녀가 된 기분입니다. 가서 진료를 빙자하여 수다도 떨고, 간식도 얻어먹고 마지막에는 위로도 얻어오지요. 얼마 전에는 집을 나서는 저의 등을 쓸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래 왔다갔다 하면 힘들텐데 좀 쉬어가며 일해유~"
ⓒ박지영
또한 의료는 의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의료는 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 모든 의료인과 환자들을 비롯한 우리 공동체의 것이며, 의사는 다른 주체들과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며 합의해 나가는 일원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몇 번의 방문 진료 에피소드에서 저는 이미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함께 환자의 건강을 위해 뛸 때 얼마나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화 참조 ☞ : '집에서 죽고싶다'는 환자, 이젠 재활 의지에 불타 오르다, "입원을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질병만 다루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나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뛰고 있는 간호사, 치료사, 방사선사 등 모든 의료인들을 비롯해 주민센터와 구청의 공무원, 자원활동가들, 심지어 환자의 이웃들까지도 같이 나서야 합니다.
제가 민들레의료사협에서 일하면서 관계를 쌓아온 환자들을 돌이켜 보면, 제대로 된 의사-환자의 신뢰 관계가 건강에 얼마나 큰 자산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를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의사가 곁에 있어 언제든지 건강에 대해 상의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진단명'에 쫓겨 닥터 쇼핑을 하거나 병원과 병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민간이 하기 힘든 전염병 관리나 의료취약지역의 문제는 따로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겠지만, '동네 의사로서 생각하는 공공의료'는 의사-환자의 신뢰 관계에 기반한 일차 의료의 강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네에서 일하는 일차 의사의 역량을 키우도록 도와주고 방문 의료를 활성화하며 특히 일차 의료 의사와 타 직종들이 팀워크를 이루어 전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의료와 복지를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민들레의료사협에서 꿈꾸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009315805882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